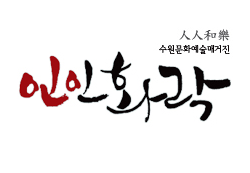Story
17호 [책나들이] 고전의 향기로 역사와 인물을 물들이다!
고전의 향기로 역사와 인물을 물들이다!
글 김희만 역사학자·문학박사

고전통변(古典通變) 노관범 지음, 김영사, 2014- 이 책은 이렇게 시작된다. ‘고서는 언제 보아도 마음이 설렌다.’ 참 공감이 된다. 아마도 인문학에 관심이 있는 독자라면 같은 생각이 들 것이다. 이런 책을 손에 쥐면 나도 마음이 설렌다. 이를 이심전심(以心傳心)이라고 해야 할까? 서점에서 책 나들이를 하다 보면 눈길이 가는 곳이 있다. 고전, 역사, 인문 그리고 지식 등등… 부제(副題)도 재밌다. ‘1714〜1954 전환기 우리 고전에서 발굴한 뜨겁고 매혹적인 역사의 현장’이라고 포장을 하고 있다. 더 나아가 “변화의 흐름을 꿰뚫고 싶다면 전환기 고전을 읽어라.”라는 매우 선정적인 광고로 책을 팔고 있다.
『고전통변』은 격동의 한국역사 240년(1714〜1954)을 다루고 있다. 전통과 근대를 아우르는 시기다. 우리 역사에서 아련한 추억이 깃든 잊을 수 없는 시대인 것이다. 고전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되리라. 그런데 통변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그 모체는 주역(周易)의 ‘변하면 통하고, 통하면 오래간다(變則通 通則久)’라는 구절에서 연유하는 것으로 통은 계승, 변은 혁신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옛 것을 이으면서도 새로운 것을 꿈꾼다는 법고창신(法古創新)과 온고지신(溫故知新)과도 통하는 말이다.
이 책의 편집자가 쓴 글을 잠시 엿보면 ‘한 번 읽기에는 좋지만 다시 집어 들기는 싫은 책이 있고, 처음에는 어렵지만 읽을수록 향기가 나는 책이 있다. 『고전통변』은 후자였다’라는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실 이 책을 집어든 순간 여러 면에서 감정이 오버랩 된다. 우선 그 장정이 마음에 든다. 묵직하고 정감이 간다. 그 목차를 보는 순간 더욱 다정해진다. 말로 형용하기 어려운 행복감이라고 하면 지나칠까. 18세기 지성사, 19세기 지성사, 전환기 지성사, 20세기 지성사 등이다. 왠지 이 책을 읽으면 18세기 이후 20세기까지의 지성인들과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이 팽배해진다.
역사와 고전은 불가분의 관계다. 역사를 이루는 근원은 고전에서 시작된다. 고전은 역사를 담고 있는 그릇이기 때문이다. “십 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지만 백년을 살아도 사람 사는 세상은 그다지 다를 것이 없어 보인다. 그렇지만 세상을 보는 시야를 더 길게, 조금 더 길게 장구한 역사의 시야로 확장해서 본다면 일상의 눈에서는 보이지 않던 뜻밖의 깨달음과 만날지도 모른다.” 인생을 관조한 지성인의 소리로 들린다. 이 세상에 절대적인 것은 없다고 한다. 모든 것은 상대적일 뿐이라는 것이다. 절대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왔던 것이 실제로는 상대적인 것이었음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실학(實學)이며, 상대적인 것들을 반드시 안과 밖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구획하여 어느 한쪽에 배치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것, 그것을 허학(虛學)이라고 한다. 우리는 실학을 추구하고 있는가.
고전에 대한 답을 찾아보자. “요즈음 우리 사회에서 고전이 힘을 얻고 있다. 대학가에서는 고전 읽기를 강조하고, 출판계에서는 고전 다시 쓰기를 기획한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얄팍한 인스턴트 지식들을 떨쳐내고 심신을 울리는 묵직한 고전의쇳소리를 듣고 싶은 것”은 것이 사실이다. 초정 박제가는 ‘고전은 언제나 우리의 안에서만 맴돌고 있으며, 그래서 고전을 알기 어려운 것이라고’ 말한다. ‘조선 안의 중국’이 문제였던 것이다. 조선은 유사 이래 중국과 교류하며 항상 중국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자부했는데 그것이 병폐였다는 것인데, 이 시대에도 유효한 외침이다.
19세기 지성사에서는 그 소제목이 우리를 인도한다. 시대가 바뀌면 사람 사는 세상도 다른가 보다. 무언가 새로운 현상이 도래한 것이다. 바둑을 잘 두는 법, 미래를 향한 진정한 미덕, 서울에 퍼진 가짜 도학의 소문, 서울의 새로운 인간 군상, 시대 전환기의 새로운 독서 전략, 함경도 유학자가 남긴 화려한 문집, 서북 사람들도 기호 사람이다, 식견을 기르는 글쓰기 등 이전보다 구체적이며, 변화를 꿈꾸는 세상이 보인다. 그것이 시대상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전환기의 지성사에서는 우리가 익히 아는 역사가 등장한다. 임오군란이 그것이고, 단발령 전야, 대한제국, 우산국과 폴란드와 청나라의 공통점, 그리고 일본이 꿈틀댄다. 특히, 1882년 임오군란 이후 1894년 청일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 청나라 세력이 장기간 조선에 정치적 영향을 미침에 따라 서울에서는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 문화와 학술교류가 활발히 일어나게 된다. 오래된 조선과 새로운 조선이 섞여 있는 혼란한 시대에 조선의 앞날을 걱정하기도 한다. 이후 자주의 마음과 자강의 기운, 대한제국의 위기를 계기로 각성하게 된다. 전환기의 상황이 그대로 전해진다.
20세기의 지성사는 공화국의 미래로부터 시작한다. 양명학의 전설, 허생 이야기 박씨 이야기, 그리고 해외 한국학의 열기, 개성상인의 대만 여행, 8,15 해방 등이 전면에 등장한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사항이다. 이 조항은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1조에서 유래하는 오랜 헌정사적 전통 위에 있다. 대한민국의 건국과 관련해 요즈음 뜨거운 감자로 자리하고 있다. 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다만 장담하기는 어렵다.
이 책은 그리 평범하지가 않다. 좋게 말해서 고전이지만 그내용은 역사의 현장이다. 다양한 인물과 만나는 재미도 있다. 아는 인물도 다수 보이지만 소박하고 구수한 선비들도 만나게된다. 이 책의 기본 글쓰기는 서설(序說)을 붙이고, 번역에서는 저자와 출전을 밝히고, 이를 해설하고, 그리고 원문과 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서설이 이 책의 저자 목소리다. 다양한 지식을 소개하고 다음에 따라올 내용을 앞에서 유도한다. 글쓰기와 더불어 읽는 재미도 쏠쏠하다. 맛있는 반찬을 선물하고있다.
김희만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에 관심이 많으며, 이를 대중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의 역사와 문화』, 『한국사의 이해』, 『화랑세기를 다시 본다』 등의 공저서와 「수여선의 개통과 사회변화」 등 다수의 논문이 있다. 최근 인터넷신문 뉴스피크에 ‘헌책방의 인문학’이라는 코너를 마련하여 격주로 글을 연재하고 있으며, 대학에서 학생들을 만나는 일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