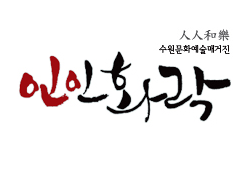Special Feature
14호 [특집 3] 화성 둘레길을 걸으며

[특집 3]
화성 둘레길을 걸으며
글 사진 남기성 사진작가
화성 성벽은 지형에 따라 축성되어 오르내리기도 하고 불규칙하게 굽어져 있어 지루함 없이 걸을 수 있다.
이 길은 화려하지 않고 눈에 띄는 풍광이 없지만 성벽을 따라 사색하며 음미하는 즐거움은 걷는 사람에 따라 무궁무진한 볼거리와 멋을 느끼게 할 수 있다.
제주도 올레길의 성공은 전국적으로 도보여행 붐을 일으켰는데 수원에도 걷기 좋은 길이 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화성의 성벽을 따라 밖으로 한 바퀴 도는 성곽둘레길이다. 화성을 한가운데서 보면 서쪽에 팔달산이 있고 그 반대쪽인 동쪽에도 나지막한 언덕이 있으며 그 사이를 수원천이 흐르고 그 주위로 약간의 평지가 펼쳐져 있다. 화성 성벽은 지형에 따라 축성되어 오르내리기도 하고 불규칙하게 굽어져 있어 지루함 없이 걸을 수 있다. 이 길은 화려하지 않고 눈에 띄는 풍광이 없지만 성벽을 따라 사색하며 음미하는 즐거움은 걷는 사람에 따라 무궁무진한 볼거리와 멋을 느끼게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화성둘레길 중에서 축성 당시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는 서남암문 부근부터 화서문까지 팔달산에 속해 있는 구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다. 화성을 한 바퀴 돌자면 어디에서 시작해도 되지만 팔달문에서 팔달산 방향으로 시작해 본다. 팔달산 화장실에서 성벽을 따라 경사가 가파른 길을 5분정도 오르면 팔달산 일주도로를 지나게 되며 약수터를 만나게 된다. 약수 한 모금으로 목을 축이고 남포루 외벽을 따라 조금 더 올라가면 야트막한 성곽이 가로막는다. 서남암문에 붙어 있는 용도이다. 용도를 따라 왼쪽으로 돌아가면 바위군락이 나타난다.
『화성성역의궤』에는 화성을 축성한 돌을 숙지산, 여기산, 권동의 석록산, 아어산 그리고 팔달산 남록에서 채취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여기가 바로 팔달산 남록이다. 이곳 팔달산 남쪽 능선에는 당시에 돌을 캐내던 자국이 지금도 선명히 남아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정을 사용해서 돌에 구멍을 뚫은 다음 그 속에 물푸레나무나 밤나무로 만든 쐐기를 박고 물을 부어두면 나무가 팽창하는 힘에 의해 거대한 돌이 갈라지는 원리로 돌을 채취했다고 한다. 숙지산이나 석록산, 아어산등의 돌을 캐던 자리는 접근하기 어렵거나 개발로 이제는 볼 수 없지만 이곳은 바위 군데군데에 쐐기를 박았던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돌을 채취한 흔적을 쉽게 만날 수 있는 곳이다.
바위지대 바로 아래는 청동기 시대의 유적인 고인돌이 2기가 있고 조금 밑으로 고인돌 2기가 더 있다. 이 고인돌들은 오랜 세월의 흔적으로 훼손이 심하여 보호 울타리가 없었다면 그냥 바위덩어리와 구분하기도 쉽지 않을 텐데 엄연히 돌칼과 청동검이 출토된 당당한 고인돌이다. 당시 이 지역은 삼한시대 마한의 모수국으로 추정하고 있어 이 고인돌은 모수국의 지배층 무덤으로 추정하고 있다.
화성둘레길은 성벽을 따라 도는 길이기에 성벽과의 대화이다. 문헌에는 성벽이 201,404괴의 돌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데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 저마다 모양이 다른 크고 작은 수많은 돌과 하나하나 눈 맞춤하며 걷는 것도 색다른 즐거움을 줄 것이다.
화성은 축성된 지 220년의 세월이 지나며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으로 훼손되어 현대에 와서 복원되었지만 팔달산에서 화서문, 장안문을 거쳐 동북공심돈까지의 성벽에는 원형 그대로의 모습이 보존되어 있는 곳이 여러 군데 있다.
추분이 지나면 태양이 남회귀선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는데 겨울철 서남암문에서 화서문까지의 성벽은 화성둘레길의 백미이다. 한여름 태양이 중천에 있거나 흐린 날 성벽을 보면 특이하게 보일 것 없지만 늦가을부터 이듬해 늦겨울 오전 10시경부터 오후 2시까지 약 4시간 동안 성벽에 겨울 빛이 비춰지면 다양한 형상이 성벽에 나타나기 시작한다. 돌을 매끄럽게 다듬지 않아서 생긴 거친 정 자국에 비스듬히 비추는 한줄기 겨울 빛과 200여년의 세월이 만들어 내는 현상이다. 우아하지도 세련되지도 않은 이 형상들을 마주해보면 저절로 힘이 느껴지는데 어느 것은 석공의 얼굴처럼 엄숙해 보이기도 하고 어떤 것은 웅장한 조각처럼 아우라가 느껴지고 때로는 추상회화처럼 보여 경이감이 들기도 한다.

(좌)자연환경과 잘 화를 이루있는 수원화성의 성벽
(우)정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성돌
문헌에 성벽은 642명의 석공에 의해 쌓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돌 하나하나를 자세히 보면 무수히 많은 깨트린 자국들이 보인다. 이 자국들은 저절로 깨진 것이 아니라 석공의 노동으로 깨트린 흔적들이다. 깨진 것과 깨트린 것은 모양은 비슷할지라도 의미에서 큰 차이가 난다. 깨진 것은 스스로 된 것이지만 깨트린 것은 인간의 노동과 의식이 담겨 있는 것이다.
성벽은 아름다움을 위해 만든 것이 아니다. 오로지 튼튼하고 견고하게 쌓는 것이 축성의 목적일 것이다. 미를 감상하기 위한 대상이 아니기에 멋있게 만들려는 기교를 부리지 않았고 오로지에 견고하게 쌓으려는 충실함만 있을 뿐이다. 본연의 모습에 충실함으로서 아무렇지 않은 것 같은 평범함이 보는 사람을 형식에 얽매이게 하지 않고 자유롭게 한다.
화성에서 경관이 수려한 곳이라면 방화수류정과 용연을 비롯하여 동장대의 장쾌함 그리고 국보1호 숭례문과 동급의 건축물이라는 팔달문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오래전부터 널리 알려진 곳은 수원시민이나 웬만큼 여행을 다닌 분들은 모두가 경험한 곳이기에 다시 찾기가 쉽지 않다. 경험이란 한번 겪고 나면 그 강도가 떨어지기 마련이어서 사람들은 새로운 경험을 찾아 끊임없이 여행을 떠나는 것이다. 또한 많은 사진작가들이 화성을 촬영하는데 대개 화성의 풍광이 수려한 주요시설물을 중심으로 찍고 성벽을 조명하는 작가는 거의 없다. 화려하지도 않고 울긋불긋한 단청도 이름난 대목장이 만든 것도 아니라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성의 토대는 성벽이다. 화려해야 눈에 들어오고 장식이 많아야 눈이 번쩍 뜨이는 안목으로는 성벽의 멋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돌을 채취한 흔적- 아무런 가식이 없는 노동의 힘으로 생긴 건강미가 넘치는 이 형상들은 태양이 이동함에 따라 하나 둘씩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하다가 오후 2시가 넘으면 대개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빛과 노동과 세월이 만들어낸 뭐라 표현하기 어려운 경이로운 성벽의 변신이 막을 내린 것이다.
이 길은 겨울철만 걷기 좋은 길이 아니다. 봄날 벚꽃하면 경기도청 벚꽃길이 유명하지만 도청 벚꽃이 지기 시작하여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질 때 팔달산에는 산벚꽃이 피기 시작한다. 이때 쯤 멀리서 팔달산을 보면 군데군데 하얗게 꽃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산벚나무이다. 특히 서포루에서 팔달산 일주도로를 만나기까지 군데군데 있는 수령이 오래된 키가 큰 산벚나무가 꽃을 피우면 산길 일대가 온통 하얗게 물든다. 봄바람 부는 오후 흩날리는 벚꽃잎에 취해 보면 복사꽃이 아니어도 무릉도원에 온 착각이 든다. 또한 비온 뒤 꾸둑꾸둑 해진 꽃길을 걸으면 걷는 것이 행복이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하는 길이다.
남기성 수원토박이 사진작가로 우리지역의 사라져가는 모습을 꾸준히 기록하는 ‘수원을기록하는사진가회’에서 활동하며 2001년 ‘화성의 성벽’사진전을 비롯하여 ‘이의동·하동 옛사진집’ 등을 발간했다.